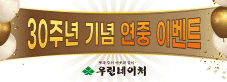이번 구제역·고병원성AI에 대한 방역과정에서 개별방역 미흡보다는 오히려 이를 운영하는 시스템 오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보다 효율적인 백신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번 구제역·고병원성AI에 대한 방역과정에서 개별방역 미흡보다는 오히려 이를 운영하는 시스템 오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보다 효율적인 백신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반복되는 구제역과 고병원성AI,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제110회 한림원탁토론회’<사진>에서 류영수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구제역이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또는 수년 단위로 반복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 박멸대책이 확립되지 않는 등 정부 정책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입원인이나 전파 경로 등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역학전문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방역업무에 행정직 관료가 배치되는 것은 방역의지마저 의심케 한다”고 전했다.
박최규 경북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고병원성AI의 경우 이번에 종식한다고 해도, 철새 이동 등에 따라 올 겨울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국가 방역체계 체질을 확 뜯어고쳐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지정토론(좌장 박용호)에서 김성식 경기도청 동물위생방역과장은 현장방역 인력 보강·기능 강화, 살처분·매몰비용 국가 100% 지원 등을 주문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구제역백신 효능 신뢰도 제고와 공급용기 현실화, 항체형성률 관리 등을 대책방안으로 내놓았다.
정현규 한국양돈수의사회장은 일원화된 방역 교육시스템, 현장 수의조직 강화, 일정 규모 이상 도축시설의 자체 수의사 고용 의무화, 선제적 정보전달 등이 질병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