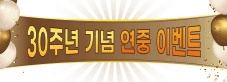[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유산·식불도 신고 요구…임상증상으로 ASF 구분 어려워
올들어 양돈현장의 돼지 질병 피해가 유난히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PRRS나 PED 등 소모성질환에서부터 흉막폐렴과 회장염에 이르기까지 각종 돼지 질병으로 인해 양돈농가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성돈구간의 폐사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농가의 경제적 손실 뿐 만 아니라 당장 ASF 방역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상증상만으로 ASF와 일반적인 돼지 질병에 대한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의심축 신고단계 부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9일 강원도 춘천에서 두 번째로 ASF 발생이 확인된 양돈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농장의 경우 이전부터 일반적인 돼지 질병에 의한 폐사가 꾸준히 이어져 온 데다 앞서 이뤄진 철원지역 양돈장의 ASF 의심축(폐사) 신고가 다른 질병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ASF 유입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춘천 양돈장의 첫 번째 ASF 확인을 계기로 방역당국이 실시한 방역대내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과정에서 ASF 발생이 확인됐다.
이 뿐 만 아니다.
최근에는 고열과 폐사 등 ASF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없던 농장에서도 ASF가 확인되고 의심축 신고가 잇따르면서 양돈현장의 혼란을 더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발생한 김포 양돈장 ASF의 경우 식불 증상에 따른 의심축 신고와 검사를 통해 확인됐다. 재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기는 했지만 같은 날 검사가 이뤄진 평택 양돈장 역시 전화예찰 과정에서 ‘조산 증상이 있다’ 는 농장주의 설명에 따라 방역당국이 검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포천의 한 양돈농가는 “방역당국이 의심축 신고대상으로 강조하고 있는 증상이 없는 양돈장이 국내에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솔직히 하루에 몇차례는 의심축 신고 여부를 놓고 갈등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비단 나 혼자만의 현실은 아닐 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물론 ‘일단 의심스러우면 신고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기본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혼란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수의전문가는 “양돈현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급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ASF 바이러스 감염시 돼지에게 발견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나 농장내 전파 양상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양돈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해줄 방역당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