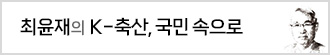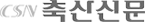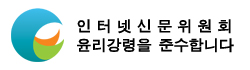[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화방류시 4배이상 추가비용 불가피
액비화, 물량증가·살포지 확보난 걸림돌
축산농가도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 생산토록 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촉진법) 제정과 함께 정부가 하위법령 체계 구축에 돌입했다. 환경부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돼지 2만두 사육농가와 하루 100톤 이상을 처리하는 공동자원화시설도 의무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면서 축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한 양돈농가가 해외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하위법령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남 창녕의 부흥영농조합법인 하태식 대표(전 대한한돈협회장)는 이번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바이오가스 설비를 갖춘다고 해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 가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혐기성 잔존물의 처리, 즉 정화 방류 또는 액비화를 위한 추가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혐기성 잔존물을 정화방류할 경우 질소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일반 정화방류의 3배에 달하는 비용(톤당 5만원)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유지 보수 감가상각 비용 등의 추가비용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게 하태식 대표의 분석이다.
액비화 역시 살포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 음식물쓰레기 투입량 증가 등 바이오가스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은 처리물량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덴마크와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전기, LPG, 열 생산 등 바이오가스 활용률이 70%에 달하고 있는 반면 사실상 전기 생산에만 집중돼 있는 우리나라는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탄소저감이라는 바이오가스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
하태식 대표는 “현실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은 또 다른 의무생산자로 포함된 지자체 차원의 공공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외에 방법이 없다”며 “아울러 전기생산 확대 등 바이오 가스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전방위적으로 검토,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