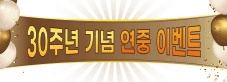| ■우리 민족의 한반도 정착과 함께 해 온 도야지 돼지는 그 조상이 멧돼지다. 약 1만 년 전부터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 온순한 가축이 되었는데, 본래의 야성을 버리고 가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잘 따르는 천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석기시대 유적인 경남 양산, 황해도 몽금포 등지의 출토품에 돼지 이빨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우리 선조들은 그 때부터 멧돼지를 길들여 집돼지로 사육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지(三國志)> 위서동이전(魏書東夷傳) 부여조에는 돼지 이름을 딴 ‘저가(猪家)’라는 부족장 명칭과 ‘州胡(주호: 제주도)에서는 소나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으며, <후한서(後漢書)> 부여국전에는 고구려 시조인 동명(東明)의 탄생신화에 “갓난 사내아이(동명)를 돼지우리에 버리라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우리나라는 적어도 2천 년 이전부터 돼지를 길렀던 것으로 보인다. ‘돼지’는 본래 새끼돼지를 일컫는 명칭이었다. 고어의 ‘돝’이 어미돼지이고, ‘도야지’는 송아지, 망아지처럼 짐승새끼를 일컫는 ‘-아지’를 ‘돝’에 붙여 돼지새끼를 이르는 말이었으나 ‘돝’이 사어(死語)가 되면서 ‘돼지’가 표준어가 되었다. ■모든 길흉 행사에 빠져서는 안 될 ‘나눔의 먹을거리’ 고대(古代) 한반도 동쪽지역에서는 초상이 났을 때 관 위에 돼지를 올려놓고 죽은 자의 양식으로 삼았고, 고구려 시대에는 구혼을 할 때 여자 집에 재물보다는 돼지와 술을 보내 혼인을 성사시켰다. 이처럼 돼지는 우리 삶의 의식(儀式)에 없어서는 안될 가축이었는데, 지금도 피로연과 초상에 돼지수육이나 삶은 돼지머리고기가 빠지지 않고 상에 오르는 것은 여기서 기인한 것이다. 큰 굿이나 동제(洞祭) 때마다 돼지는 신성한 제물로 쓰이고, 각종 고사 때도 어김없이 귀신을 쫓는 돼지머리가 등장한다. 이는 우리 민족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돼지와 가장 친근한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농번기 새참과 김장보쌈, 대동제 등 일상의 모임부터 잔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모든 길흉 행사에 돼지를 성스러운 제물이자 ‘나눔의 먹을거리’로 즐겼다. (자료제공: 농협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