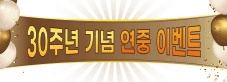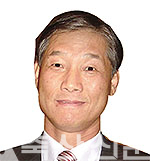 유재복 대표이사
유재복 대표이사
((주)편한소)
우리나라에 젖소 사양을 위한 TMR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벌써 꽤 오래 전이다. 그 당시 젖소에게 먹일 풀이 없어서 영양가가 별로 없고 소가 잘 먹지도 않는 볏짚과 배합사료만으로 한 마리가 하루에 20Kg의 우유를 생산하도록 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때문에 TMR이라는 새로운 사료 급이 방법은 목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루 종일 젖소에게 먹일 풀을 얻기 위해 수많은 땀을 흘려야만 했던 시절이었기에 젖소에게 더 없이 좋은 소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TMR 방식이 훌륭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젖소에게 줄 풀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었겠는가? 그나마 영양을 전공한 사람들이 만드는 사료 회사의 배합사료가 젖소에게 생기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여줬던 게 사실이다. 그 덕택에 사료 회사가 젖소에게 영양을 공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TMR 시스템 도입 초기에 사료 회사가 배합비 작성에서 급여까지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TMR(Total Mixed Ration)은 말 그대로 완전사료로써 젖소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하루에 먹는 건물섭취량을 기준으로 채워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 하루에 공급하는 사료의 건물 섭취량에는 물론 배합사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졌던 것이다.
배합사료의 판매 물량을 늘려야 하는 사료회사 입장에서 배합비를 작성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TMR에 들어가는 배합사료의 양을 늘려야 했을 것이다. 물론 실질적으로 조사료의 양이 부족하고 거기에 더해 질까지 좋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배합사료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안전한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 더욱이 소규모 사육형태에서 우군의 능력 편차 때문에 생기는 영양소 요구량의 차이는 결국 자동급이기 등을 통해서 개체별 착유사료나 기능성 배합사료를 다르게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TMR은 말 뿐이고 겨우 섞음 사료로 젖소가 좀 더 먹게 하는 효과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번식이 안 되거나 일찍 도태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문제를 목장에서 겪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서 심각하다.
이제 조사료 일부를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잘하는 목장들은 옥수수를 생산하여 엔실리지를 담가서 외국과 비슷한 TMR을 만들어 먹일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그렇게 되었음에도 좀처럼 배합사료의 역할은 바뀌지 않고 있다.
미국과 같이 TMR 원료를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거나 이스라엘과 같이 계획적인 생산에 의해 TMR을 만들 수 있다면 TMR 방식은 현재로는 최선의 사양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TMR은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된 개념에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사료 값이 곡물 값보다 비쌀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풀은 가능한 적게 사용하면서 젖소에게 발생하는 대사성 질병 문제는 최소화 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착유용 사료를 TMR 원료로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TMR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성인데 착유사료를 TMR원료로 사용하는 건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배합사료의 역할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TMR 공장과 자가배합 목장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 목장에서 사용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나마 사용하는 원료들의 성분도 신뢰할 수가 없다. 그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소량으로 공급되는 원료들의 성분이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정밀한 배합비에 의한 TMR을 만든다고 해도 젖소들은 매일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걸 TMR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어떤 목장은 아직까지도 TMR방식이 아닌 분리급이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진짜 TMR을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정보를 제공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선진국에 비해 거의 2배나 되는 우유 생산비를 생각할 때 이제는 관련자들 모두가 작은 이익에서 벗어나 전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께 노력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