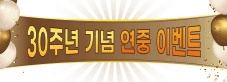[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지자체 76.3%가 행정구역 80~100% 사육제한
자의적 허가 취소·폐쇄명령 무소불위 권한까지
“일선 지자체 축사 인허가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
축산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축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선축협 조합장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 신규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축사 인허가 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여론이다.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가축분뇨법 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이 지자체 조례로 전면 위임돼 사실상 축사 설치를 불가능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가축분뇨법 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자체 조례로 전면 위임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들은 조례 고시를 통해 상한 없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자체에 따라 소(한육우) 거리 제한을 2천m까지 정한 곳도 있다. 이는 환경부 권고안 70m의 28.5배에 달한다. 젖소 거리 제한도 최고 2천m까지 조례로 정한 지자체도 있다. 이 역시 환경부 권고안 110m와 비교하면 18.2배에 달한다. 돼지와 닭·오리 역시 거리 제한 최고 지자체는 3천m로, 돼지의 경우 환경부 권고안 1천m의 3배, 닭·오리는 권고안 650m의 4.6배에 달한다.
특히 지자체 절반 이상이 행정구역의 90~100%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해두고 있다.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118개 지자체 중에서 6곳(5.1%)이 행정구역 100%를 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행정구역 90% 이상을 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지자체는 56곳(47.5%)이다. 행정구역의 90~100%를 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사실상 축사설치를 원천 봉쇄한 지자체는 118개 중 62곳(52.6%)으로 과반을 넘는다. 80% 이상을 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지자체(28곳)까지 더하면 76.3%에 달한다. 행정구역 중 50% 미만을 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지자체는 7곳(5.9%)에 불과하다. 당연히 행정구역 80~100%를 사육제한구역으로 정한 지자체에선 노후 축사 신축이나 개축과 이전은 물론 신규농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가축분뇨법에는 가축사육 제한(제8조)에 허가 취소(제18조) 규정까지 있다. 지자체장에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 재량만으로 축사 건축허가 거부가 가능한 인허가 체계도 문제이다. 현행법상 제한구역이 아닌 곳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주관적, 자의적 판단으로 축사 허가 거부가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1의2)에서 건축물이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파괴, 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축협 조합장들은 이에 따라 가축분뇨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설정 범위를 명시하고, 지자체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령 개정 또는 정부 지침으로 축사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1의2) 일부 개정, 또는 정부 지침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아닐 경우 축사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협 조합장들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각종 규제로 축산 생산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후계 축산농가와 신규진입 농가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