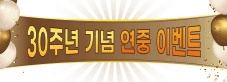박용호 교수(서울대 수의과대학)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고개를 쳐든 FMD 발생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고개를 쳐든 FMD 발생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다.
동물방역, 검역, 위생은 물론 농산물, 수산물 검역 및 위생관리를 총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가슴속에 있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한다.
우선 한시적 땜질이 아닌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전체 질병방역과 관리를 총괄하는 농축산부의 전문가 부재와 전문가 집단인 검역본부, 지자체간의 소통과 협력이 미흡하다.
사람에서 신종플루 등의 환자가 발생하면 전문가 기관인 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1급 기관장으로 농축산부 검역본부와 동일)'가 나서서 전문적인 결정과 대응하고 전문가 브리핑,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시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농축산부 차관급에서 질병 관리를 총괄하는 보직이 존재해야 한다. 타 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검역본부와 관련협회, 농민, 소비자 등 국민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이끌어서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긴급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관리 시스템 구축에 농축산부가 아닌 정부(총리실 및 국가안전처)가 직접 나서야 한다.
‘심각’ 수준에서만 시행되는 현 방역체제를 강화하여 국가 재난형질병이 발생하면 농축산부는 물론 지자체,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들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셋째 FMD백신 적용의 전문성이 준비돼야 한다.
적극적인 백신 개량연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 발생 바이러스 정보 등을 전문가들과 즉시 공유하여 학계와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FMD 발생시 신속하게 적합한 균주를 이용한 백신 공급과 투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경우, 한국양돈수의사회 등 전문가들이 발생초기에 제안했던 국내발생 바이러스나 유사성이 높은 O형 단일백신을 확보하여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접종할 수 있어야 했다.
현실 대응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모돈과 자돈 1회 접종하던 방식은 평시에 진행하고 있으나 일단 발생이 현실화되면 즉각 자돈은 2차례 이상 접종하여 소위 ‘부스터 효과'를 이뤄내야 한다. 특히, 현재 발생하는 FMD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특이 항체(IgG)를 산생토록 유도돼야 한다. 아울러 현재 사용중인 백신의 일부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 해소를 위한 보조제 개발들도 필요하다.
백신접종만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사람이 인플루엔자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감염농장, 농가, 차량 등을 멀리하고 개인위생과 지역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가는 국경전염을 차단하는 국가방역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또한 동물 개체의 면역 증진을 위한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 즉, 백신효과와 방역 증대를 위해서는 개체 및 집단 면역을 상승시키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비특이 면역증강제 등을 엄격하게 선발, 투여함으로써 질병 방어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동물은 물론 사람에서도 동일한 접근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글로벌시대에 부합한 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
미국 동식물방역청(APHIS)과 동일한 체제를 갖추어서 FTA 확대 및 비관세장벽 (NTB) 철폐에 따른 우리나라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검역, 방역, 위생 종합시스템 구축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질병방역, 검역, 위생담당 검역본부를 ‘동식물방역청 (가칭)’으로 개편하여 모든 책임과 권한을 줘야 한다. 물론 시간이 걸리는 일이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FMD, AI, 지긋지긋하다. 하지만 아프리카돈열(ASF), bTB(소결핵병), BVD(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미국 발생 고병원성AI(H5N2) 등 또 다른 국가 재난형질병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 학계, 관련협회와 농가 모두 한마음이 돼 소통과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밝은 다음세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