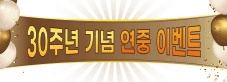| 국내시장 포화에 따라 해외시장이 동물약품 업계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있다. 동물약품 업체들은 잇따른 해외진출을 통해 매출 및 수익 확대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가능성을 열더니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우선 정보가 부족하다. 그리고 활동무대도 더 넓혀야 한다. 본지에서는 1, 2회에 걸쳐 해외시장 현황 및 기회ㆍ제약 요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 업체가 넘어야 할 걸림돌을 짚어보고자 한다. ’06년 수출 총액 1천210억…동남아·아프리카 집중 GMP 기준 국제화·수출상품 R&D 투자 강화돼야 ■동물약품 해외시장 전세계 동물약품 시장규모는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157억1,500만달러 규모다. 실질적 성장률은 2.2%이며 2010년쯤에는 1.9%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징 중 하나는 상위권 회사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판매액 중 상위 10개 기업의 점유율은 약 72%에 달한다. 상위 15개 기업으로 치면 81% 정도 된다. 제품군별로는 사료첨가제 13%, 생물학제 제제 22.6%, 항생제 15.8%, 구충제 28.4%, 애완동물 치료제 등 20.2% 분포를 보인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축우(27.2%)가 가장 많고, 양돈(16.3%), 양계(11.2%), 양(5.1%)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애완동물 등은 40.2%를 차지했다. 대륙별로는 북미 34.2%, 서유럽 30.7%, 동아시아 16.2%, 남미 11.4%, 동유럽 4.6%, 기타대륙 2.9% 등으로 나타났다. ■수출 현황 국내 기업의 동물약품 해외수출액은 2006년 기준으로 총 1,210억원(원료 약품 1,039억원, 완제품 171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 1741억원, 2004년 1713억원, 2006년 1210억원, 2007년 458억원으로 조사됐다. 2007년 급감 이유는 한국바스프(라이신)가 그해 5월 생산중단한 것이 컸다. 한국바스프는 2006년까지 1000억원 이상 수출했다. 완제품의 경우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물약품 수출액(원료제외)은 177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3억원보다 24% 늘어났다. 2006년과 2007년 수출총액 171억원, 286억원과 비교해서도 폭발적인 성장세다. 동물약품 수출상대국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총 23개국에 불과하다. 그 역시 대부분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에 집중돼 있다. 2007년 국가별 점유율은 인도네시아(15.5%), 나이지리아(15.0%), 파키스탄(14.1%), 베트남(9.4%), 방글라데시(8.7%), 케냐(8.7%), 말레이시아(5.3%), 기타(18.7%) 순으로 나타났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70.3%로 가장 컸고 아프리카 24.7%, 서아시아 4.1%, 유럽 0.5%, 남미 0.3% 등을 보였다. ■기회 요인 우선 세계 동물약품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의 동물약품 수입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한미ㆍ한EU간 FTA 체결 등 국내 축산여건 악화는 국내 동물약품 업체들에게 수출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있다. 그리고 업계 스스로 수출촉진 협의회 등을 통해 국내의 어려운 여건을 수출로 타개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한다. 업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장조사, 바이어 상담, 제품 등록 등 수출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 위상 강화는 동물약품 수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 IT, 선박 등 선진화 사업의 명성으로 동물약품 해외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높여줬다. 동시에 동물약품 산업도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게 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시장 자료 수집, 외국의 GMP 실사시 동행 등을 통해 업계의 수출에 힘을 실어줬다. ■제약 요인 대내적으로는 경쟁력있는 수출상품이 부족하다. 또한 국내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시설투자 및 기술력이 낮아 품질관리가 미흡하다. 특히 경쟁력있는 수출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비지원 등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다국적기업의 점유율이 커 국내 수출업체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곤란하다. 아울러 중국기업의 품질경쟁력 확보는 경계대상 1호로 지목된다. 최근에는 국내 GMP 기준이 수출상대국에서 요구하는 GMP 기준과 상이해 수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했다. 수출상대국에서는 자국의 기준이 아닌 국제 수준의 WHO, EU기준으로 평가해 적부여부를 판정한다. 게다가 수출을 선도하는 수출업체 및 전문인력이 미흡한 것도 지적된다. 수출업체간에 수출 상대국에 대한 시장여건 및 수입조건 등의 정보교류가 부족해 효율적인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