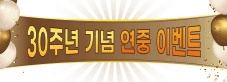(전 농협대학교 총장)
(전 농협대학교 총장)
▶ ICT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을 이르는 말이다. 요즘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ICT와의 융합이 화두이며 기계 장비 설비 등 공산품 제조나 서비스분야에서는 실제로 아주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미래의 축산도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축산분야에서의 자동화와 ICT융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먼저 생산 분야인 목장 현장에서는 어떤가. 요즘 스마트 팜(smart farm)이 많이 거론된다. 과연 목장은 얼마나 스마트 한가? 가축을 사육함에 있어 노동력을 줄이고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 되어 왔다. 인건비가 계속 올라갈 뿐만 아니라 목장 일에 숙달된 노동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목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은 사료급여다. 전에는 사료를 손으로 주던 것을 이제 자동급이장치로 손쉽게 준다. 사료빈[feed bin]을 설치하고 파이프라인을 축사 사료급여조(給與槽)로 연결하여 사료가 바로 이송되는 시스템이다. 중·대규모 목장에서는 대부분 이 장치를 갖추고 있다. 사료포대를 메어 나르는 수고를 덜어준다. 젖소의 경우는 산유량에 따라 개체별 사료요구량이 달라지므로 고안된 것이 개체별 자동사료급이(給餌)시스템이다. 젖소마다 자신의 하루 사료섭취량이 입력된 메모리장치를 목에 걸고 다닌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료급이기는 우사나 운동장에 설치돼 있다. A 젖소가 하루 10kg의 배합사료를 먹도록 입력되었다고 가정하면, 이 소가 사료급이기에 접근하면 언제고 사료가 나오지만, 10kg이 다 차면 더 이상 사료가 나오지 않는다. 사료빈에 남아 있는 재고는 자동으로 체크되어 사료주문 시기를 놓칠 일이 없다.
▶ 가축에게 물은 필수적이다. 어느 축종이든 모두 자동급수기를 이용한다. 과거처럼 물을 퍼서 나르는 일은 하지 않는다. 돼지, 닭, 오리는 주둥이로 급수꼭지[nipple]를 건드리면 물이 나오게 돼 있다. 소는 워터컵(water cup)에서 물을 마신다. 겨울에는 얼지 않도록 열선이 작동한다.
▶ 축사시설 환경관리 자동화시설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환기를 위해서 축사 천정자동개폐장치, 축사 측면의 커튼 자동개폐장치, 여름철 소를 시원하게 해주는 자동환풍기, 돈사 내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안개분무장치, 자동 냉·난방장치, 산란계의 자동점등장치, 집란장치, 암모니아 등 가스 자동탐지기 등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RFID(무선주파수인식장치)를 이용해서 출입차량을 체크하고, 소독을 위해서 자동소독장치가 운용된다. 축사주변의 하천지역은 드론을 활용해서 소독한다.
▶ 또 다른 힘든 작업이 분뇨처리작업이다. 목장에서 가축분뇨 자동청소장치(manure scraper)가 활용되고 있는데 분뇨를 자동으로 긁어내주는 장치로서 편리하다. 분뇨처리는 한군데로 모으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분뇨의 자원화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해야만 한다. 분뇨의 고액분리장치, 미생물발효시설 등이 활용되고 있다.
▶ 가축 생육상태 관찰이 매우 중요한 줄은 알지만 항상 옆에 붙어있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암소의 발정징후 발견은 수정적기를 맞추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소 목이나 발목에 장착하는 무선 발정탐지(發情探知)장치인데 미약발정도 놓치지 않고 탐지할 수 있다. 개체별 이동기록장치(생체에 컴퓨터칩을 이식)를 이용해서 가축의 건강상태 이상유무도 조기에 알아낼 수 있다.
▶ 젖소는 착유를 하는 것이 다른 축종과 다른 점이다. 낙농목장이 바쁜 것은 바로 이 착유작업 때문이다. 낙농 초창기에는 두수가 적어서 손으로 젖을 짰다.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몇 마리 안 되니까 가능했다. 규모가 커지면서 착유기(搾乳機 milking machine)가 보급됐다. 그러나 착유바켓스를 들고 우유저장탱크까지 날라야 했으므로 두수가 많아지니까 이 방식도 힘들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파이프라인 착유시스템(pipeline milking system)으로서 우유가 착유되자마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냉장탱크로 바로 빨려들어 간다. 손쉽고 빠르고 위생적이다. 이즘에는 로봇착유기가 개발, 보급되고 있다. 한 대로 70~80마리의 젖소를 착유할 수 있다. 인력 2명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로봇착유기의 작동 방식을 보자. 유방에 우유가 불어나 젖 짤 때가 되면 젖소가 로봇착유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자기 차례를 기다린다. 다투지 않고 질서 정연한 것은 훈련 덕분이다. 앞에 소가 나가면 문이 열리고 다음 소가 들어간다. 위생적인 착유를 위해서 따뜻한 물로 유방을 세척하고 유두를 소독한다. 네 개의 젖꼭지에 유두컵(teat cup)이 부착되고 착유가 시작된다. 착유가 끝나면 유두컵이 탈착되어 세척, 소독된 후 원위치로 돌아가 다음 번 소의 입장을 기다린다. 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실용화 됐다.
▶ 가축의 개체별 유전정보와 개량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개별 정보가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낙농의 경우 소의 개체별 산유량, 우유성분 분석치, 질병경력, 백신컨트롤, 번식기록, 경영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하면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다. 이제는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다.
▶ 요즘 축산인들은 스마트 폰을 유용하게 활용한다. 축사 내·외부에 CCTV를 달아 놓고 원격지에서 축사내부 가축들의 활동상태를 체크하고 외부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데도 활용한다. 스마트 폰에, 스마트 팜이다. 앞으로 ICT와의 융합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농협대학교 총장)
(전 농협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