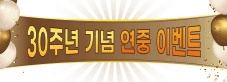한우농가들의 분위기는 불안감을 넘어 격앙돼 있다. 안 그래도 사료 값 상승에 가격 폭락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굳이 이 때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이어 한미FTA비준까지 처리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런 농가의 심정을 지난 6일 여의도 한미 FTA저기 농민결의대회 현장에서 만나 한 농가와 나눈 대화를 통해 재구성해 보았다.
솔직히 두렵다. 그 충격과 여파가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렵다. 한편으로 억울하다.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그로 인해 내가 희생돼야 한다면 명예라도 남아야 할 것인데 이건 그것도 아니다.
요즘 같아서는 소 한 마리 팔아 사료 값 대기도 벅찬데 솔직히 막막하고 답답할 뿐이다.
대통령은 한미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4년여를 끌어온 줄다리기의 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죽을힘을 다해 버텼지만 그 결과는 4년의 시간을 번 것 뿐. 결과는 애초에 나와 있었던 것 같다.
누구는 그렇게 말했다.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한미 FTA를 대비해 한우산업이 준비해 온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시간의 문제가 아닌 의지를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우산업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농가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어야 했다. 무조건 농가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말아달라.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도축장 구조조정문제, 농가조직화라는 허울아래 이름만 남아있는 한우사업단,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한우수급조절문제, 아직 정착되지 못한 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 쇠고기 생산이력제, 청정화와는 자꾸 멀어지고 있는 FMD 까지 풀지 못한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 짐을 그대로 안고 어디로 우리를 자꾸 떠미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다.
한우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없는데 매년 3%씩 줄어드는 15년이라는 관세철폐 기간 동안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느냐.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평생을 한우를 키우면서 살았다. 앞으로도 이 땅에서 소를 키우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