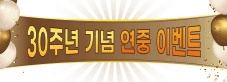농가수 30년만에 90% 이상 줄어…고령화·후계농 부재로 이탈 가속화
농협 ‘젊은이가 찾아오는 축산사업’ 주목…청년 육성 제도적 뒷받침을
축산현장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심각한 고령화와 후계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빠르게 줄면서 젊은 청년들을 축산농가로 육성해 미래축산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농협축산경제(대표 이기수)가 자체자금 1천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젊은이가 찾아오는 축산구현’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농협은 축사은행과 축산후계농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와 조직을 만들고 일선축협을 통해 예산과 자금을 투입하면서 축산업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지난 30여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축산생산액 증가 폭 못지않게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축산농가 숫자다.
1987년 농림부 통계를 보면 한육우 사육농가는 85만4천269호에 달했다. 젖소농가 3만8천131호, 돼지농가 30만2천891호, 닭 26만8천704호가 있었다. 146만2천호가 넘었던 것이다. 그러던 농가숫자는 30년 만에 90% 이상 사라졌다.
2015년 3월 현재 11만6천200호만 남았다. 87년과 비교하면 8% 남짓한 숫자다.
농가들이 급감한 배경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배경에는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이 다. 농협이 지난해 7월 조사한 결과 전체 축산농가의 고령화율은 44.3%로 이미 초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농업인구 전체 고령화율 37.3%, 국내 전체 고령화율 12.3%와 비교해 봐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농촌경제연구원 허덕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8일 정예인력을 64세까지의 종사자로 볼 경우 축산현장의 노동력 부족 확률은 조만간 90%를 넘어설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허덕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4대 축종의 농가숫자를 한우 7만3천호를 비롯해 8만2호 수준으로 추정했다.
반면 지금 축산현장에서 후계농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농가들이 적지 않다. 농협축산경제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전국의 축산농가 2천53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년 이내에 축산을 그만두겠다는 농가들이 50%에 달했다. 이들의 축산포기 배경에는 후계자 확보여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대로라면 축산생산기반이 뿌리 째 흔들리는 상황이 멀지 않았다. 한국축산이 시장개방이나 외부요인보다 인력자체가 없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농협축산경제의 ‘젊은이가 찾아오는 축산사업’은 체계적인 축산후계농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범 축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축산인들은 농협사업의 성과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한 발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까지 연계된 후계농가 육성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